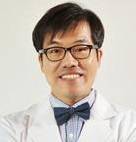
하지만 기간이나 횟수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. 단 한 번을 나가더라도 단 한 분에게 최선을 다했더라도 그 시간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.
특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, 노인들, 후진국 빈민들에게는 더 그러하다. 아픈 치아를 하나 뽑아줬을 뿐인데 평생 가장 편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환자를 직접 경험하고 나면 의료봉사의 유혹은 더 심해진다. 진료실에서 멱살을 잡힐 정도로 환자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현 의료실태를 감안하면 더 그렇다.
사실 봉사란 말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. 개인적으로는 의료섬김이라는 말을 더 즐기는 편이다. 봉사란 말은 왠지 내가 뭔가를 많이 내려놓고 헌신하는 느낌이 강해서 싫다. 내 스스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다. 하지만 진료를 할 때 환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.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어찌 그러지 못해서 내가 그 사람을 섬겨야 하는 업이 생겼다고나 할까?

2년 만에 같은 곳으로 진료를 가보니 내가 치료했던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는 시간도 있었다. 앞니 레진은 떨어져 있었고 어금니의 미라클믹스는 온전했다.(오, 역시 미라클!) 발치를 해야 하는데 방치해서 만성염증으로 골수염이 생긴 환자들이 꽤 있었다. 완치에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지만 소파 후에 약만 안겨주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.
내가 찾은 아프리카 세네갈의 오지마을은 칫솔이 보급되지 않아 나뭇가지를 씹어 치아를 닦는 곳이다. 그런데 단 것을 많이 먹는지 성인 중 성한 어금니를 가니 사람이 드물다. 세네갈의 평균수명이 55세 정도인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바로 이 치아 건강이 아닌가 싶다. 이번에는 칫솔을 잔뜩 가지고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아이들에게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칫솔질을 가르쳐주었다. 아픈 치아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봉사를 나가서도 틈틈이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. 야간진료까지 강행해서 그야말로 뜨거운 곳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.
이렇게 먼 곳을 다녀오고 나면 대부분 격려를 해주신다. 하지만 가까운 곳에 봉사할 곳이 많은데 왜 그리 먼 곳까지 돈을 쓰며 가냐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. 그 말도 맞다. 그래서 가까운 곳도 간다.
하지만 먼 곳도 가야 한다. 우리나라가 지지리도 못살던 시절에 우리에게 의료봉사를 나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긴 책을 권해드리고 싶다. 두 달 동안 배를 타고 오신 분들도 계셨다. 그 책을 보면 빚진 느낌이 들어 그 빚을 갚으려면 이제는 우리 중 누군가가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은 든다.
처음 해외봉사를 나갔을 때 그런 빚진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다. 우리네 삶이 다 그런 것 같다. 조금은 빚을 진 듯한 느낌으로 사는 것. 빚쟁이같이 살지 말고 남에게 조금은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부담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배려하며 사는 것. 세상의 온도가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?
김동석 춘천예치과 원장
기사 원문 보기
'나의 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2016년은 새롭게 블로그 시작하는 해...^^ (0) | 2016.01.22 |
|---|---|
|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(0) | 2011.01.05 |
| Coffee...... and Barista (0) | 2010.04.13 |
| 트위터... (0) | 2009.06.14 |
| 난 (0) | 2009.06.05 |